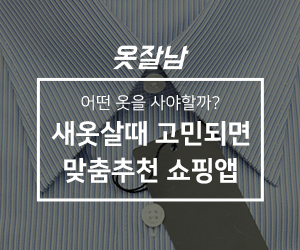헬스
소화제, 해열제 말곤 살 게 없다…'무늬만 상비약' 편의점, 이대로 괜찮나
 약국 문이 닫힌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편의점을 찾았다가 허탕을 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2012년 도입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13년째 겉돌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 이후 단 한 차례의 품목 확대도 없이 13개 품목에 묶여 있는 것도 모자라, 그나마도 2개 품목은 생산이 중단되어 실제로는 11개 제품만 구매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적으로 최대 20개까지 지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3년간 단 하나의 품목도 추가되지 않으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약국 문이 닫힌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편의점을 찾았다가 허탕을 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2012년 도입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13년째 겉돌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 이후 단 한 차례의 품목 확대도 없이 13개 품목에 묶여 있는 것도 모자라, 그나마도 2개 품목은 생산이 중단되어 실제로는 11개 제품만 구매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적으로 최대 20개까지 지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3년간 단 하나의 품목도 추가되지 않으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최근 한 소비자 단체가 10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이러한 문제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응답자의 90% 이상이 편의점 상비약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지만, 동시에 현재의 제한적인 품목에 대해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건강권 침해'로 인식하고 있었다. 소비자들이 가장 시급하게 추가되기를 원하는 품목은 소아용 해열제, 증상별 진통제, 제산제, 화상 연고, 지사제 등 일상에서 흔히 필요한 의약품들이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한밤중이나 휴일에 아이가 아플 때 약국을 찾아 헤매다 결국 편의점에서 빈손으로 나와야 했던 경험을 토로하며, 국민의 생명권과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상황이 13년째 제자리걸음인 것과 달리,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일본은 2009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부작용 위험이 적은 2, 3류 의약품은 약사가 아닌 '등록판매사'도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미국은 한발 더 나아가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시간이나 수량 제한 없이 다양한 일반의약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며, 심지어 편의점 자체 브랜드(PB) 의약품까지 판매될 정도로 '셀프 메디케이션'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다. 가벼운 경증 질환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계적인 표준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유독 '안전성'만을 내세워 보수적인 태도를 고수하는 국내 상황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음을 방증한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요구가 거세고 해외 사례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품목 확대가 이뤄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약사 단체의 강력한 반대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약물 오남용과 안전성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품목 확대보다는 복약 상담이 가능한 약국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정부의 직무 유기'라고 꼬집는다. 약사법에 따라 3년마다 품목 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약사회의 반대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무관심 속에 2018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복지부 역시 의료 취약지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실행 의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